'유령마을'엔 아직도 방사능 100배
-
입력 : 2010.04.26 02:58 / 수정 : 2010.04.26 09:57
24년전 오늘, 체르노빌의 '검은 재앙'은 이 마을을 덮쳤다
방문비 1000달러 내고 "사고나도 괜찮다" 각서… 오염된 옷은 현장서 태워
반경 30㎞엔 50명 귀환… 왜왔냐 묻자 "고향이니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3㎞ 떨어진 프리피아트(Pripyat) 마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한 듯 보였다. 오솔길 옆으로 늘어선 나무에선 가지가 멋대로 웃자라 좁은 길 이곳저곳을 가로막았고, 한쪽 벽이 부서진 쇼핑센터와 창문이 날아가고 천장이 무너진 공동주택 안은 아직도 깨진 유리와 벽돌 파편들이 희뿌연 먼지가 덮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진공 상태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한 마을은 화창한 4월 햇살 속에서 한층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유령 마을(Ghost Town)'이라는 별명 그대로였다.
24년 전 프리피아트는 주민 4만9000명인 작은 마을이었다. 1970년 체르노빌 발전소 젊은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조금씩 돈을 걷어 만든 곳이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해 일군 프리피아트는 1986년 4월 26일 밤, 원자력 발전소 제4기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
50t가량의 핵물질이 공중으로 1㎞ 이상 솟아오르고,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찰나, 영문도 모른 채 집 밖으로 나왔던 주민들은 화재나 방사선 노출로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
25일 기자가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13㎞ 정도 떨어진 잘리시아(Zalysya) 오염 지역에 들어갔을 때, 승객 10여명을 태운 버스가 오염 지역 입구에 멈춰 섰다. 우크라이나인 가이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는 사고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다가 2000년에야 마침내 영구 가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체르노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전소에서 10㎞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80대 사바(Sava)와 한나(Hanna) 부부. 이들은 사고 후 강제 이주됐으나 10여 년 전, 자신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왔다. 주변에선 "발전소에서 최소 30㎞는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했지만, "일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사바 할아버지네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정부가 체르노빌에서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분류한 곳, 즉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30㎞ 지역에는 지금도 약 50명이 살고 있다. 이들도 사고 이후 정부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발전소는 문을 닫았고 논밭은 오염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는 없기에 오염 지역에서 방사선 오염 물질 수거 작업 등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관광상품이 된 체르노빌
2002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지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목적·자격과 상관 없이 무조건 정부와 연계된 여행사의 투어 프로그램(1인당 250~1000달러)에 등록해야 방문을 허가했다. 그후, 일부 체르노빌 주민은 관광업종으로 전환해 현재 방문객을 상대로 한 레스토랑·카페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잘리시아에는 작은 음식점뿐 아니라, 극소수의 투숙객을 위한 소규모 호텔과 지역 안내를 해 주는 안내 센터까지 생겼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어렵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오는 환경 전문가나 언론인, 혹은 "사고가 생겨도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는 각서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관광객들이다.
운전수 표트르(Pyotr)도 체르노빌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방사선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체르노빌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는 그는 "체르노빌은 이제 많이 정화됐다"고 했다.
"운전하다가 들판에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보곤 해요. 방사선 영향 탓인지 대체로 좀 크긴 해도 텔레비전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기형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엔 근래 보기 드물게 야생 짐승이 많았어요. 체르노빌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방사능 농도 아직도 100배 가량
하지만 지금도 체르노빌은 위험한 곳이다. "체르노빌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한 표트르 역시 체르노빌 지역에서 차를 몰 때 자동차 도로 옆으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나무가 있는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다. 폭발 직후 나뭇잎이 시뻘겋게 변해 '붉은 숲'이라고 불리던 숲은 초록색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흙 속엔 치명적인 수준의 오염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곳을 방문한 날, 폭발 사고를 일으킨 4기 발전소가 시야에 바로 보이는 10㎞ 안쪽 지점에서 자가 측정기로 잰 방사능 농도는 시간당 약 400 마이크로 뢴트겐이었다. 자연 상태 방사능 농도(시간당 5~30 마이크로 뢴트겐)의 100배 가까이다.
체르노빌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과 이동 차량은 매번 체르노빌을 벗어나기 전, 정밀 기계로 방사선 오염 수준 측정을 받아야 하고, 만약 옷이나 신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

- ▲ 오윤희 특파원
■그들은 왜 돌아오는가
사고 당시 기계공으로 일하던 세르게이 프란추크(Franchyk·49)는 체르노빌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친구를 둔 덕에 25년 전 사고를 누구보다 빨리 접했다.
젊은 혈기로 "화재 진압을 돕겠다"며 집을 나서는 그를 완강하게 막은 이는 잠자리에서 한 살배기 큰딸을 어르고 있던 아내였다. 프란추크가 그날 밤의 사건이 단순한 대형 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구소련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다른 체르노빌 주민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고, 6년간 철도공으로 일했다. 하지만 1999년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체르노빌로 돌아와 지금은 사고가 난 발전소에서 40㎞ 떨어진 곳에 살면서 체르노빌 여행사에서 일한다.
체르노빌에서 살던 그의 이복 남동생은 사고 5년 후에, 폭발 당시 불을 끄던 친구는 지난해에 병으로 죽었다.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잠복기를 거치는 방사선 장애의 특성상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돌아온 이유를 묻자 그는 "태어나 자란 곳이니까"라고 했다.
☞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모스크바 기준 시각),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약 98㎞ 떨어진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 발전소 4기 원자로가 폭발해 대량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때 방출된 방사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배에 달한다. 방사능 낙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사고 인근 지역 생태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방사능 후유증 희생자도 수십만명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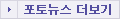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